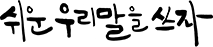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 거버넌스, 너 뭐니?
- 등록일: 2021.09.15
- 조회수: 45,621
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 거버넌스, 너 뭐니?
최보기 /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구로구청 구정연구관
 최보기.
최보기.관악구청 청년정책과
구로구청 구정연구관,
‘최보기의 책보기’ 연재 서평가,
저서 『거금도 연가』 『놓치기 아까운 젊은 날의 책들』 『박사성이 죽었다』 『독한시간』
어쩌다 지방자치단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돼 ‘늘공’(늘 공무원)들과 일한 지 몇 년째다. 그사이 확실히 알게 된 하나가 ‘공무원은 문서로 일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과업은 문서와 증빙으로 시작해 문서와 증빙으로 끝나는데, 첫 문서와 마지막 문서 사이에 ‘문제 될 것’만 없으면 과업은 성공으로 종결된다.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방침서, 계획서 등 각종 문서를 읽다 보면 ‘다양한, 시너지, 효율화, 극대화, 제고, 향상, 체계적’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게 저 단어들을 애용한다. 주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저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해 문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어뿐만이 아니다. 문서 틀도 대부분 같고, 문장들 역시 과업에 따른 주어, 목적어 등 핵심 단어만 다를 뿐 비슷하다. 그럼에도 문장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전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국장도 팀장도 주무관도 그렇게 써왔지만 아무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어 사용도 마찬가지다. 그 뜻이 애매하거나 매우 어렵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이 다 쓰는 상황이면 굳이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으로 누가 시비를 걸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씀’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퍼실리테이터, 아트테리어, 크리에이터, 벤처인큐베이터, 큐레이션, 젠트리피케이션, 버스킹, 잡코칭,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인플루언서, 엑셀러레이터’ 같은 외국어가 공문서에 자주 쓰이고 ‘메타버스, 콜드체인, 부스터샷’ 등이 새로 등장했다. 이들에 비하면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페스티벌, SNS, MOU, 네트워크, 컨설팅, 스타트업, 거버넌스’ 등은 쉬운 축에 들어간다.
 그림 1. 공무원은 언제나 문서로 일한다.
그림 1. 공무원은 언제나 문서로 일한다.거버넌스! 자치단체장 선출 시대라 그런지 공문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외국어 중 하나다. ‘민·관·학 거버넌스의 효율적 구축과 다양한 운영으로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함’에 쓰인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이쪽 업계에 처음 왔을 때 자주 접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검색’으로 공부했다. 아직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버넌스를 자습으로 이해한 바는 이렇다.
국가를 운영하는 기구인 정부(Goverment)는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으로 법규, 제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나라가 굴러간다. 이를 통치(統治)라 한다. 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스릴 치(治), 두루 다스린다’는 통치도 딱히 마땅한 단어는 아니나 달리 대체어가 없다. 거버넌스는 정부의 통치, 즉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집행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인(단체)이 함께 참여하는 행위 또는 기구(조직)를 말한다. 쉽게 말해 민간인 활동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00정책위원회’를 조직해 정부가 하는 일(행정)을 같이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치와 대립하는 ‘협치, 민관 협치(協治), 협치 행정’ 등 우리말로 대체하는 연유다. 당연하나 ‘민관 협치’는 누구든 대충이라도 그 개념을 짐작하는 반면 거버넌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는 낮고, ‘동네 주민’은 100% 모른다.
 그림 2. 민·관·학 거버넌스를 표현한 사진
그림 2. 민·관·학 거버넌스를 표현한 사진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왜 협치를 비롯해 쉬운 ‘예술 장식가’ 대신 ‘아트테리어’를, ‘회의 도우미’ 대신 ‘퍼실리테이터’를 쓰게 될까? 필자 나름대로 연구가 아닌, 추정하는 이유는 대략 이러하다.
첫째, 외국어는 왠지 섹시하고, 뭔가 모르게 있어 보인다. 과업 완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흔적도 보인다. 행여 상관이나 결재권자가 ‘아트테리어가 뭐냐’ 물으면 외웠거나 메모해둔 대로 ‘뉴 트렌드’를 설명하는 보람이 있다.
둘째, 지금껏 써왔기에 익숙하다. 우리말 대체어는 쉽기는 하나 낯설고 어색하다. 왠지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촌스럽다.
셋째, 딱히 알고 있는 우리말 대체어가 없기도 하나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귀찮다. 사업 계획서에 예술 장식가를 아트테리어로 썼다고 문책당한 공무원도 없다.
넷째, 어려워야 질문이 없다. 우리말로 쉽게 쓰면 상관이나 의회 의원들의 질문과 따짐, 추궁이 많아진다. ‘어려운 외국어 이름을 단 아파트에 살면 시골 시부모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엉터리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이치다.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내는 추가경정예산 사업 계획서 산정 예산을 ‘3,209백만 원’ 대신 ‘32억 9백만 원’이라 써놓으면 당장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는 ‘겐세이’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서비스 수혜 주민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노후 간판 교체 지원 사업만 하더라도 ‘예술 장식가가 제작한 간판으로 교체’보다 ‘아트테리어가 디자인한 간판으로 리모델링’에 상인들의 반응이 훨씬 호의적이다. 참여하는 전문가도 예술 장식가보다 아트테리어로 불리길 원한다. 공무원은 주민이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밝혔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다 아트테리어라고 쓰는데 나 혼자 튈 이유가 없다. 용감하게 우리말 대체어를 썼다가 행여 그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면피’할 구실이 없다. 이 다섯째, 여섯째가 코아 컴피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