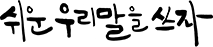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2 공모전 당선작] 보람상 - 정체불명의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꿔요!
- 등록자: 김경진
- 등록일: 2022.11.07
- 조회수: 397
정체불명의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꿔요!
김경진(보람상)
“GR마크랑 NEP가 뭐니? 이런 용어들 때문에 요즘은 기사를 읽는 것도 턱턱 막히는구나!”
“GR마크요? 글쎄요. NEP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이 건넨 기사를 읽어보니, 그 기사만으로는 GR마크와 NEP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신문 기사 어디에도 이에 대한 우리말 용어나 설명은 없었다. 뜻을 찾아보았더니 GR은 ‘Good Recycled(굿 리사이클드)’의 약자로 우수 재활용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컫는 용어였다. NEP는 ‘New Excellent Product(뉴 엑설런트 프로덕트)’의 약자로 우수 신기술 제품을 말하는 것이었다.
같은 기사에 나와 있는 ‘Net-zero(넷 제로)’라는 말도 눈에 띄었다. 탄소중립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Net-zero’라는 외국어를 써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어느덧 친환경과 탄소중립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들을 볼 때마다 관련 단어들이 온통 어려운 외국어로 돼 있어서 좀처럼 피부로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젊은 나조차도 그 뜻을 단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나이 지긋한 아버님은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정부에서 걸핏하면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면, 요즘엔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로부터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생활 요리 수업을 듣는데 강사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팜투테이블(Farm to Table)’이라는 용어를 꺼냈다. 당시 수업에는 나와 같은 중년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많았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나를 향해 “강사 선생님이 얘기한 팜투 어쩌고가 뭐야?”라고 물으셨다. 바로 그 옆에 앉은 어르신도 반응이 비슷했다.
그러고 보니 저번 수업 때도 강사분이 해썹과 지에이피(GAP) 인증 등 어려운 용어들을 말해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났다. 낯선 외국어 정책 용어들이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열의를 꺾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강사분에게 식품과 관련된 정책 용어를 보다 쉬운 우리말로 얘기해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정중히 부탁드렸다.
그러자 강사분께서는 “어머나, 수강생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단어들이 입에 붙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영어 그대로 말씀드렸네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셨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하며 웃었다. 그리고는 팜투테이블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지에이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바꿔 다시 설명해주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수강생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니까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말을 쓰면 단어는 길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감한 시간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수준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였다.
얼마 전 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엄마, 스쿨존에 옐로 카펫이 설치됐어!”라고 내게 말했다. 우리말도 아직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외국어를 섞어 쓰는 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접하는 공공언어에도 다른 영역에서처럼 지나치게 많은 외국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스쿨존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옐로 카펫은 ‘건널목 안전 구역’ 등으로 바꿔 쓰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조차 수없이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파노라마 촬영, 바우처, 홈페이지, 스쿨투게더, 시스템, 가이드, 워크북’ 등 다양한 외국어들이 섞여 있었다. 학교에서 진행한 행사 안내문에는 ‘아카데미, 힐링캠프, 힐링데이, 에코캠프, BOOK 페스티벌’ 등이 적혀 있었고, 학교 누리집에도 ‘팝업존, 배너, 사이트맵, 포털시스템, 사이버신고’ 등 무수히 많은 외국어가 있었다.
일련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적어도 우리집에서만큼은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제안했고, 대체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나오면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 목록을 참고해 우리말로 알려주기도 했다.
국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분명 외국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정작 중요한 정책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최대한 쉬운 우리말을 써야 정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주체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쉬운 우리말 사용을 습관화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