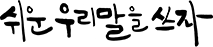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2 공모전 당선작] 북돋움상 - 그건 그냥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 등록자: 김영주
- 등록일: 2022.11.07
- 조회수: 410
그건 그냥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김영주 (북돋움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으로 한창 세상이 어지럽던 어느 날, 엄마의 전화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할아버지셨다. 밥은 먹었는지, 손주들은 잘 있는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안부를 물으시더니 문득 잠시 말을 멈춘 후에 말씀하셨다. “그… 코로나 블루가 뭐고?” 단어 하나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했다기엔 조금 민망하셨던 걸까. 그저 평소 같던 안부 인사 끝에 잠깐의 망설임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질문이 나는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충격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 내 사고방식으로부터 온 충격이었다. 질문을 듣자마자 잠시 ‘할아버지가 그렇게 쉬운 단어도 모르시나?’ 하는 의아함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는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거침없이 가르쳐주시고 해제 없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줄줄 읽으시는 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어도 역사드라마의 고증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에게 ‘박학다식한 지혜로운 어른’이었다. 그토록 똑똑한 어른이 뉴스를 즐겨보지 않는 나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모르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적어도 ‘코로나 블루’가 영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다. 코로나 블루는 영어였다.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사람들이 앓게 되는 일종의 우울감’. 20대 후반인 나는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쉬운 영어였지만, 할아버지께는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외국어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비단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었다. ‘온택트’, ‘스펜테믹’부터 시작해 ‘덤벨 경제’, ‘메가시티’, ‘다크코인’…. 하루하루 새로운 외국어들이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쏟아졌다. 당장 스마트폰을 가져와 검색해볼 수 있는 나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모르는 말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뉴스 자막이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끼시는 할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돋보기를 껴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외국어의 안개 속에서 얼마나 헤매셨을까?
할아버지는 그날 약간의 뿌듯함과 함께 고마움이 섞인 인사로 전화를 끊으셨다. 나에게는 너무나 쉬웠던 단어가 할아버지께는 배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전화 끝에 나는 수많은 언론에서 ‘코로나 우울증’이 아닌 ‘코로나 블루’라는 외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저 하나 더 줄어드는 글자 수 때문일까? 우울증이라는 말을 개념화해서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렇다면 ‘코로나 파랑’이라고 하면 되었을걸, 왜 굳이 영어였을까?
문득 내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겪은 아주 인상 깊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버건디(와인)색이 잘 어울려 “팥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라고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던 어느 손님, ‘트렌디한 옷’이라는 말 대신 ‘최신 유행’이라는 말을 썼더니 90년대 사람이냐며 비아냥거리던 동료들, ‘몸에 붙는 형태’라는 말 대신 ‘핏(fit)한 디자인’이라는 말을 권장하던 직원 교육,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어는 멋있고 우리말은 촌스럽다.’는 문화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사실 문화사대주의가 나쁘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진부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진부하고도 상투적인 관습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에 녹아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화사대주의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치와 한복을 중국 문화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의지로 지워가는 현실은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사실만 봐도 교묘하게 녹아든 관습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외국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하나의 ‘변화’다. 수많은 존재가 함께하는 사회에서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렇기에 원래 있던 것이 새로운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현실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새로운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충돌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대체하는 것, 외국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로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주는 것이 바로 그 ‘노력’일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어떤 날은 수많은 망설임 끝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시고, 또 어느 순간은 뉴스를 못 알아듣는 자신을 탓하며 우울감에 빠지셨을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결국 할아버지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라는 또 다른 ‘블루’를 안겨줄지도 모른다.
그날 할아버지의 전화는 내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줬다. 대체어를 찾아 우리말을 써보려는 노력은 ‘우리의 문화를 지킨다.’는 거시적 목적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하는 세상, 빠르게 밀려 들어오는 모든 새로움으로부터 나의 할아버지를, 나의 할머니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코로나 블루를 모르셨던 할아버지의 모습 위로 터치형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기까지 며칠이 걸렸던 할머니가 보인다. 뒤이어 키오스크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는 엄마와 큐알코드를 켜지 못해 뒷사람을 기다리게 했던 아빠가 떠오른다. 나는 그 속에서 어렴풋이 내 미래를 본다. 내 수년 뒤의 어느 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점철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짝 힘주어 말한다. “그건 그냥 ‘코로나 우울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