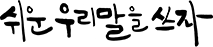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1 공모전 당선작] 으뜸상 - ‘언어 복지’, 언어에도 사람이 산다
- 등록자: 박성근
- 등록일: 2021.12.29
- 조회수: 1,275
‘언어 복지’, 언어에도 사람이 산다
박성근(으뜸상)
2013년 겨울, 우리 청의 각 국장들이 한데 모였다. 다음 해 각 국의 주요 사업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최종 교차 검토를 하는 회의였다. 회의에서 우리는 다른 국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업무의 문제점을 서로 조언해주곤 했다. 그러나 사실 일종의 불문율처럼 다른 국의 사업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관해 왈가왈부하지는 않았다.
그날 막 기획국장이 사업 설명을 마쳤을 때였다. 당시 복지국장이던 나는 ‘Any 3 School’이라는 용어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Any 3 School’은 ‘Any one, Any where, Anything School 사업’이라고 했다. 즉 어느 분야든 재능이 있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는 교육 사업이었다. ‘재능 기부 연결 공적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이름을 영어로 짓는 데서 지적 감각성을 찾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했다.
사실 회의가 열리기기 얼마 전에 잘 아는 시민 단체 대표님께서 나를 찾아와 이 내용을 이미 하소연했었다. 그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마련한 설명회에 초대받았는데, 바로 그 ‘Any 3 School’이 너무 불편했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완곡하게 설득하니 더 말을 못하신 것 같았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대로 다른 국장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러나 나는 옆자리의 기획국장에게 조심스럽게 사업 이름이 불편하다는 말을 꺼냈다. 덧붙여 앞으로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넌지시 암시했다. 그분은 일리가 있다는 표정은 지었지만 ‘Any 3 school’에 애착이 커 보였다. 그러나 나는 직무를 떠나서라도 쉬운 공공언어 쓰기는 주민보다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며, 이것이 ‘언어 복지’, ‘주민 복지’라고 생각했다.
“‘Any 3 School’ 대신 ‘교육 나눔 구축 사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물러서지 않고 대체할 이름까지 제안했다. 내 단호한 태도에 기획국장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 뒤로도 나는 그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기획국 과장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하는 날이 왔다. 상임위의 회의 장면은 전체 부서에서 TV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Any 3 school’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화면을 유심히 살피던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내 예상대로 한 깐깐한 의원이 바로 그 영문 이름을 담당 과장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담당 과장은 소신껏 대답했지만 오히려 그 의원은 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질의를 이어 갔다. 그러자 과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다른 이름을 꺼냈는데, 바로 ‘교육 나눔 구축 사업’이었다. 내가 기획국장에게 제안했던 이름이었다. 내심 놀라면서도 뿌듯했다. 담당 과장이 의외로 재빠르게 대안을 제시하자 의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질의를 마쳤다. 나는 그 시민 단체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고 그분은 민망할 정도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뒤 나는 기획국장으로 직무를 옮겼다. 그리고 나는 가장 먼저 우리 청 전체 부서의 조례를 정비했다. 그동안 우리 청의 조례 조문들은 같은 뜻인데도 부서마다 사용하는 낱말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우리 청의 모든 부서가 하나의 같은 기관이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가 많고 심지어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용어조차 있었다. 나는 먼저 조례심의위원회 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국어 어문 규범’과 2012년에 제정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영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 등의 낱말을 모두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입장의 고압적인 공공 언어도 모두 순화시켰으며, 어느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즉시 전체 다른 부서에서도 공람·적용하는 틀까지 마련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노력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심지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쉬운 법령 용어에 집착한다는 뒷말도 제법 들려왔다. 그러나 공직자일수록 쉬운 공공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런 노력은 훗날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법령의 용어를 정비했다. 예를 들면, ‘감량의무 이행 계획’은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더 쉽게 바꿨고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했다. 또한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라는 뜻인 ‘자’는 ‘사람’으로 바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5kg짜리 쌀 한 포대가 삶을 좌우하는 사회 취약층에서 조례를 더 많이 열람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언어는 누구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조금씩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대단한 결실을 맛보게 된다.”
꾸준함의 열매를 노래한 샤를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의 명구다. 나는 이 토방의 댓돌 같은 단단한 말을 믿는다.
이제 나도 칠순을 향해 간다. 현직에 있을 때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우리말이 서툴러 불이익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한국어 교사가 되어 그분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었다. 회갑의 나이에 가끔 코피까지 쏟아 가며 공부한 덕분에 국립 국어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았다. 오늘도 줌(Zoom)으로 미국, 나이지리아, 베트남 성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다.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상하게 우리말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말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내 가슴 속 귀엣말일 것이다.
나는 요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위드 코로나’에 도리질을 한다. ‘함께 이기는 코로나‘ 로 하면 어떨까? 오늘도 나는 옛 근무 기관의 최근 조례 모음집을 펼쳐 보았다. 내가 그토록 외친대로 잘 정비된 조례들을 보며 기쁘면서도 조금은 힘겨웠던 추억이 떠올라 울컥해졌다. 그렇게 그리운 추억도 가끔은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