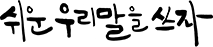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1 공모전 당선작] 보람상 - 뻐꾸기와 뱁새 알
- 등록자: 이계원
- 등록일: 2021.12.29
- 조회수: 687
뻐꾸기와 뱁새 알
이계원(보람상)
예전에 한 지방에 있는 역의 표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Kiss & Ride’, 꼭 키스하고 차를 타라는 건지 공공장소에서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싶었다. 알고 보니 역과 같은 곳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려는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는 장소란다. 외국에서는 만나고 헤어질 때 흔히 키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처음 뉴스를 봤을 때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다. 아마 누군가 외국 어디서 보고 뭔가 있어 보인다 싶어 추진한 게 아닐까 싶다. 아무리 우리 일상에서 영어가 거부감 없이 쓰인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문구까지 가져다 쓸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언어는 사람과 똑같다. 없던 말이 생겨나 널리 퍼지고, 쓰이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그런 점에서 젊은 층에서 쓰는 유행어가 한글 파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가치 있고 생명력이 긴 단어는 살아남아 국어사전에 오르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은어나 속어 또 줄임말 등의 유행어는 한 때 반짝 쓰였다가 유행이 지나면 대중의 기억에서 잊히면서 결국 사라지고 만다. 아주 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외국어, 특히 영어는 차원이 좀 다르다. 물론 다양한 생물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듯이 하나만 있던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언어생활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말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전’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비전’은 관공서나 언론 등에서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비전’의 의미를 가진 우리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처럼 ‘시각’도 적절치 않고, ‘목표’나 ‘상상력’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냥 ‘비전’, 그 자체가 어느새 가장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영어가 우리 언어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 ‘비전’도 언젠가는 ‘택시’니 ‘터미널’, ‘컴퓨터’와 같은 외래어처럼 고유어가 없는 우리말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말을 밀어내고 눌러앉은 외국 낱말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직업상 공공 기관과 일할 기회가 많다. 언젠가는 정부 세종 청사에서 회의하다 결과물을 언제까지 보내드려야 하냐고 물으니 ‘아삽(ASAP)’이라고 하여 당황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는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군 부대에서 흔히 쓰는 ‘As Soon As Possible’의 약자란다. ‘최대한 빨리’ 달라는 얘기이다. 물론 대중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재미로, 새롭다고, 또 뭔가 있어 보인다고 한두 사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퍼지고 강한 생명력을 얻고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도록 빨리’라는 낱말은 뭔가 낯설고 어색한 단어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치 큰입배스가 붕어며 잉어며 우리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먹어 토종의 씨를 말리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처럼.
언어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무게감이 달라진다. 언론은 공공의 도구로서 대중들이 표준처럼 생각하기 쉽다. 공공 기관에서 쓰는 말 또한 공공 언어로서 마찬가지 힘을 갖는다. 그래서 언론이나 공공 기관에서는 언어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언론이나 공공 기관이 외국어에 더 개방적이지 않나 싶다. 상당수의 공공 기관은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반작용인지 외국어나 유행어 등 대중 친화형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일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앞 ‘옐로 카펫’은 취지는 좋지만 우리말로 했으면 더 쉽고 좋았을 것이다.
언론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온라인 전용 언론 매체와 1인 미디어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제되지 않은 외국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곤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무제한 토론’으로 쓰면 될 일이다. 한 술 더 떠 ‘뷰 맛집’이니 ‘인싸’, ‘아싸’, ‘플렉스’, ‘밈'과 같이 누리 소통망(SNS)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유행하는 단어들을 별 생각 없이 가져다 쓰기도 한다. ‘셀럽’이니 ‘인플루언서’ 같은 낱말들은 쉽지 않은데도 언론 등에서 자꾸 쓰다 보니 어느새 우리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안착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새로운 낱말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다. ‘빅테크’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언택트’, ‘밀키트’와 같은 낱말들이 그렇다. 그때마다 언론이나 공공 기관이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외국어의 우리말 침투는 더욱 빨라지고, 언젠가는 순수 우리 낱말들이 다 사라져 외국어 낱말로만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문자는 한글이지만 낱말은 외국어인 데다 말은 국어도 영어도 아닌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구조, 예를 들면 “우리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퍼스트 무버의 마인드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큰 퍼포먼스를 창출하여 비즈니스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갑시다.”라는 식, 여기에서 주어와 조사만 바꾸면 영어 문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어 쓰지 않고 말하기’가 TV 예능 프로그램의 게임으로까지 나올 정도이니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기후 변화 시대에 여러 농산물을 수입하더라도 최소한 주식인 쌀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좁은 의미의 식량 주권이라고 했을 때,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언어가 밀려와도 최소한 우리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가는 것이 언어 주권이라 생각한다.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이고, 한국어는 한글에 최적화된 언어다.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언어들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것으로 바꿔 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우리 낱말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엔 외국어 단어들이 터줏대감처럼 눌러앉아 주인 행세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말도 우리글도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영어를 비롯한 새로운 외국어 단어가 나타나면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물론 국립국어원이나 한글문화연대와 같은 곳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전문가 조직을 꾸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씁시다’처럼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새로운 외국어 단어가 퍼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함께 언론이나 공공 기관은 신조어 등의 외국어 낱말을 앞장서 받아들여 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이제부터라도 외국어 낱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고, 위상을 떨치는 일이 될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 둥지에 알을 낳는다. 그러면 어미 뱁새는 자기가 낳은 알보다 큰 뻐꾸기 알을 별 생각 없이 품고 부화한다. 뻐꾸기 새끼는 먼저 태어나 본능적으로 작은 뱁새 알과 새끼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렇게 어미 뱁새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어미 뱁새보다 훨씬 큰 뻐꾸기로 자란다. 외국어가 뻐꾸기 새끼가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말이 뱁새 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