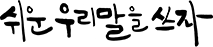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1 공모전 당선작] 북돋움상 - 한글이 언제부터 꼬부랑글자가 되었다냐
- 등록자: 박하영
- 등록일: 2021.12.29
- 조회수: 733
한글이 언제부터 꼬부랑글자가 되었다냐
박하영(북돋움상)
생각해 보면 하루의 절반을 티비로 보내는,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노후를 보내는 우리 할머니에게 티비 속에 있는 단어들은 한글로 쓰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투성이였다. 그렇다고 집에서 보던 파란 화면, 즉 티비가 아닌 바깥 세상으로 나가도 아득하게 높은 건물들은 각자 알 수 없는 외국어를 한글로 썼을 뿐 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는 말들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홀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우리 세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액티비티, 센터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 할머니를 소외시키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코로나19 백신 2차를 접종하러 가실 때 함께 병원에 들렀다. 병원에 갔다가 밥을 먹으러 들른 곳에서 할머니는 당황했다. 휴대 전화로 백신 ‘스케줄’을 확인한다는 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대형 병원 속 안내 ‘포스터’를 따라 위·대장 내시경 ‘센터’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가이드 라인’에 따라 백신 주사를 맞았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나를 이끌어 주던 모습처럼 나는 수많은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안내문에는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콜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안내문을 보고, 또 보셨다. 요즘에야 콜센터는 프로그램 이름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지만 이런 말을 보면 따라오는 씁쓸함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백신 안내문을 손에 꼭 쥐고 계셨다. 백신 안내 ‘메시지’가 휴대 전화로 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어플’에서 볼 수 있다는 나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 ‘배지’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며 병원을 나섰다. 핸드폰을 조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화면을 ‘누르세요’ 대신 ‘터치 하세요’, ‘콜센터’, ‘과한 액티비티 금지’…. 알 수 없는 꼬부랑글자 같은 한국어가 할머니 주위를 맴도는 느낌이었다. 내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한국에 있음에도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할머니의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은 함께 밥을 먹으며 내가 말하는 ‘코로나 블루’를 알아듣지 못하는 할머니가, ‘웰다잉’을 이야기하며 ‘좋은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하는 할머니가, ‘코로나 패스’ 뉴스를 보며 백신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내 앞에 선 할머니가, 커피 ’기프티콘’을 받아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내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가, 요즘 외국인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 근황을 듣는 할머니가, ‘사이드 메뉴’는 괜찮냐고 묻는 사람의 물음에 침묵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손녀의 말에는 물론, 온 세상이 꼬부랑말 천국이었다. 일상 언어뿐만이 아니라 백신 관련 용어 같은 공공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 할머니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낄 수 없었다. 나 또한 이어지는 침묵에 고통스러웠다. 숨 막히는 정적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가며 상처를 남기는 기분이었다. 폐에서 개미가 들끓는 이상한 감각, 우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외국어라는 손이 땅 밑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은 기분. 할머니는 자신이 소외되고 뒤쳐졌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막연하게 밀려오는 생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같은 언어로 살아가고 같은 자리에 서 있음에도 멀어진 거리를 느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지은 건물의 이름은 ‘클래식 시티’, ‘블루 파크’. 할머니는 홀로 내가 말하는 장소를 찾아오지 못한다. 할머니는 발전하는 도시 속에서 남발되는 외국어로 소외감을 느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 내가, 그리고 그 환경들이 미워서 속이 아팠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어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온통 한국어로 쓰인 외국어뿐이었다. 휴대 전화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내가 참여 중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지도 사업은 ‘외국인 대상 멘토링 사업’,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지하철 ‘스크린 도어’, 심지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의 이름은 ‘시니어 클럽’이다. 나는 수많은 영어 속에서 울렁임과 혼돈을 느꼈다. 공공 기관에서 쓰인 말은 한국인이라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그날 우리가 느낀 기분을 누구도 더 이상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한글이 언제부터 할머니에게 ‘꼬부랑글자’처럼 느껴지게 됐는지, 할머니는 왜 길에서 갈 곳을 잃어야만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째서 한글로 외국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다. “손녀야!” 부르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꼬부랑글자가 많아졌냐,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웃는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길거리만이 아닌 티비 방송에서도 많아진 꼬부랑글자 때문에 홀로 어딘가를 찾아가지 못해 할머니의 생활까지도 너무 축소되어버려서. 할머니가 느꼈을 소외나 그 답답함을 생각하게 됐다. 우리 할머니만이 아니라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느꼈을 소외에 관해서. 한국에서 영어를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도 그들의 삶이 축소된다는 점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게임을 오락이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뒤쳐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그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라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나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실망스럽고 퍽 먹먹했다.
그 뒤 나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외국어 사용에 관해서 찾아보다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도 알게 되었다. 할머니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나와 할머니의 대화를 변화시켰다. 내가 변화한 것처럼, 이 글을 계기로 세상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같은 한글과 우리말을 쓰면서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 사랑하는 우리말을 아껴 줄 수 있기를, 손녀와의 대화에서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우리 할머니가 매장에서 ‘스낵’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보며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과자가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기를,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꼬부랑글자를 보며 할머니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손자 손녀야, 언제부터 한글이 꼬부랑글자가 되었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