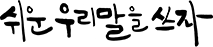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1 공모전 당선작] 북돋움상 - 한글은 나의 글
- 등록자: 안은자
- 등록일: 2021.12.29
- 조회수: 623
한글은 나의 글
안은자(북돋움상)
어린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자란 나에게 책이란 ‘그림의 떡’이었다.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다. 전쟁을 겪으신 부모님 아래서 자라다 보니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세대였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새로 받는 교과서가 너무도 좋았다. 밤이 새도록 새 교과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또 오빠들의 교과서까지도 두루 읽었는데 무척 재미있었다. 특히나 국어책과 도덕책이 가장 읽기 쉽고 재미있어 몇 번을 읽어도 지루한 줄을 몰랐다. 또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말들 대부분이 사투리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 때문일까? 나의 꿈은 자연스레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글을 쓸 때엔 늘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말을 쓰는 장점도 생겼다. 중학생이 되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체육 시간에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고, 여학생들은 계단에 앉아서 응원을 했다. 이때, 한 친구가 ‘스코어가 1:0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나는 반감이 생겼다. 점수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영어 단어 하나 달랑 섞어 쓴들 무엇 하랴 싶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지적해 봤자 친구 사이만 멀어질 테니 그냥 쓴 웃음으로 넘어갔다.
그 뒤로도 나는 우리글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덕분에 중고등학교 때에는 적절한 어휘로 글을 잘쓴다는 칭찬을 종종 받기도 했다. 대학에 못 가게 되어 내 꿈은 무산되었지만 나는 늘 우리말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영어를 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습관도 몸에 배었다. 국적도 없는 말을 사용해 봐야 내게 이로운 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내겐 딸이 두 명 있다. 아버님께서 큰아이의 이름을 어려운 한자로 지어 주셔서 옥편에서 찾느라 너무도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둘째를 낳았을 땐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그냥 시댁에 갔을 때만 부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국어대사전을 며칠이나 뒤적여서 예쁜 순우리말 이름을 찾아냈다. 덕분에 작은 딸은 취업할 때 면접관이 이름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해주어서 긴장이 풀려 좋았다고 했다. ‘힌샘’이라는 딸의 이름은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의 호 ‘한힌샘’에서 뒤의 두 글자만 따온 것이다. 나중에 아이 이름을 바꾼 것을 안 시댁에선 몹시 서운해 하셨지만, 나는 너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해인가, 나는 문학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내 글을 읽은 직원이 했던 말이 충격적이었다. ‘이런 글은 나도 쓰겠네’ 내 앞에서 직설적으로 한 그 말이 당시엔 아주 얄밉게 들렸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긴 글에 ‘콩글리시’ 단어 하나 넣지 않았고, 술술 읽기 쉽게 썼다는 자부심이 든다.
나의 일터는 교육 기관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발송한다. 공문을 접수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기에 바로 검색을 해보고는 씁쓸하게 웃는다. 찾아서 뜻을 알고 나면 버젓이 잘 살아 있는 우리말을 왜 이렇게 야금야금 어둠 속으로 몰아갈까 싶다.
‘콘텐츠, 스마트하게 일하기, 폴더 정리법, 유용한 유틸리티, 파일 네이밍 규칙’ 등 공문 하나에 이렇게 많은 외국어가 들어 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보수적인 것이 장점이고 주체성일수 있으니까 말이다. 사람이나 국어에는 반드시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나는 나’이고 개성이 있는 법이다. 국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고 소통이고, 얼굴이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는 그 나라의 자랑이며, 자존심이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글이 부끄럽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좀 더 나아 보이려는 욕심에 굳이 외국어를 중간중간 섞어서 쓰는 일은 참았으면 좋겠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 영화, 텔레비전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 매체이므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텔레비전의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쓰는 말이 한국말인지, 외국어인지 애매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요즘은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문법이 틀린 경우도 허다하다. 한글은 서서히 뒤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자라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우고 따라한다.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은 더 따라 하기 쉽고, 심지어 묘하게 어깃장을 놓는 심리까지 갖게 되기도 한다.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쓰러지기 쉽다. 이것은 건강을 잃었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말과 한글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한글과 우리말을 잃으면 우리의 중심을 잃는 것과 같고,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말, 우리 한글만 제대로 익히고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굳이 영어나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쓰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공문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견하는 국적 불명의 단어들을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안타깝다.
아니, 어쩌면 이런 것에 익숙해서 불감증이 서서히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글은 우리의 글이다. 그리고 ‘나’의 글이다.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무엇이든 올바르게 사용해야 탈이 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서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나는 꾸준히 한글 공부를 할 것이다. 아니,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글을 쓰고 싶다. 내 글을 누군가 읽을 때, 정말 술술 막힘없이 읽혀서 우리말이 단 한 단어라도 전달이 잘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글이 모든 국민에게 ‘나의 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