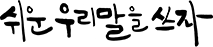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1 공모전 당선작] 북돋움상 - 외국어가 너무해
- 등록자: 정혜인
- 등록일: 2021.12.29
- 조회수: 777
외국어가 너무해
정혜인(북돋움상)
핸드메이드시티 위크, 월드 페이퍼 프로덕트, 팝업숍, 디자인 크래프트 캠프….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린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위크 2017> 행사를 구경하는데 저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공예품도시 주간? 프로덕트? 팝업숍? 에이, 크래프트 캠프는 또 뭐랴?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쓰면 안 되나?’ 내가 왠지 무식하게 느껴져 마음이 까끄름했다. 행사장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가는데 경기전 앞에는 ‘만드는 삶, 멋스런 도시’라 쓰인 버스가 서 있었다.
집에 와 어리찡찡했던 내 마음을 되삼키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쓰는 말들’이라며 행사장에서 본 외국어들을 올렸고, 버스 사진과 함께 ‘멋스런’이 아니라 ‘멋스러운’으로 쓰는 것이 맞는 거라고, ‘영어는 잘 쓰면서 우리말은 왜 틀리게 쓸까’라고 글을 올렸다. 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외국어가 거슬리기 시작했던 것이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다 어떤 작가의 출판 기념회에서 전주시장을 만났다. 나는 방명록에 글을 쓰고 돌아서는 시장에게 다짜고짜 말했다. 우리말 좀 쓰자고, 핸드메이드시티 위크, 팝업숍, 프로덕트, 워터미러, 이런 말이 뭐냐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고 외치면서 ‘가장 세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모든 전주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내 말이 끝나자마자 전주시장은 ‘반성한다’고, ‘많이 도와주라’고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있던 ‘워터미러’가 ‘거울못’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워터미러’보다 ‘거울못’이 얼마나 예쁘냐며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꾼 전주시를 칭찬했다.
그런데 2018년 2월. ‘천만 그루 가든시티 전주’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우리말로 쓸 수 없는 말도 아닌데 ‘가든시티’라니….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 하지 말고, ‘가장 세계적인 도시, 전주’라 하자고. 며칠 뒤, 전주시에서는 ‘가든시티’를 ‘정원도시’로 바꿨다.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준 전주시가 고마웠다.
2018년 11월. <‘공공기관 외국어 사용 그만’…충북 국어쓰기 조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또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북도, 전주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 글을 시청에서 봤는지 연락이 왔다. 전주도 우리말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뒤 시청 담당자들이 만나자고 하더니 조례안 가안을 가져와 보여주고는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제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자’고 했다. 재작년에 우리말 조례 입법 예고가 된 뒤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시에서 의지가 있으니 잘 해내리라 믿는다.
전주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우리말을 쓰라는 지시도 내리고, 시청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보이는 듯했으나 그 밖의 산하 기관이나 위탁 기관에서 외국어를 쓰는 일은 여전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화를 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냐, 전주 시민을 위한 행사라면 전주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대학 나온 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다, 이러다 나중에 우리말은 조사만 남고 다 외국어로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등등 나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그러고는 외국어를 쓴 글을 갈무리해 페이스북에 올린다. 나 혼자 떠들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외국어 남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누군가 자꾸 떠들어야 ‘아, 그렇구나’ 할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글을 올리면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나와 같았다. 나 혼자만 외국어 남용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다. 좋게 말하지 비아냥댄다고.(실제 내게 대놓고 “저는 선생님 ‘워딩’이 불쾌해요!”라고 말한 이도 있었다) 내가 “영어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가 살든지…”라는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모 기관에서 공간을 층마다 소개하면서 ‘커뮤니티라운지, 컨퍼런스룸, 회의실, 오픈라운지’라고 쓴 것에 화가 나 페이스북에 그 포스터를 올리고, ‘우리말부터 공부하시라’, ‘회의실도 미팅룸이라고 쓰지 왜?’라고 쓴 적도 있다. 외국어는 잘도 쓰면서 ‘역할’을 ‘역활’로 잘못 썼기 때문이다.(나중에 그곳에 가보니 ‘회의실’은 내가 말한 대로 ‘미팅룸, 워크룸’이라고 쓰여 있었다.)
비아냥대며 쓰는 글이 그들에게 불편하듯이 나도 저런 외국어를 보는 게 불편하다. 비단 나만 불편할까? 나는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뇌꼴스럽다.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왜 외국어를 쓰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외국어를 쓰는 이유는 대신 쓸 우리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멋지고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우리말이 어때서!
몇 달 전, ‘오수 펫 추모공원’(임실), ‘1004 히어로즈’(정읍), ‘에코밸리모험센터, 포레스트 어드벤처’(전라북도학생수련원)가 또 눈에 띄어 각 기관에 다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이미 정해진 이름을 바꾸는 건 불가능했다. 이처럼 공공 기관의 외국어 남용은 끝이 없다. 전라북도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는데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행사 이름이 외국어인 것도 모자라 한글도 아닌 영어로만 쓴 기관이 있었는데 내 항의 전화를 받고 바로 우리말과 한글로 고친 포스터를 올렸다. 센터장에게 전화가 왔다. 솔직히 폼 나서 영어로 썼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직원에게 전해 들었는데 모두 다 옳은 말씀이라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라는 곳에서 공간 이름을 예쁜 우리말로 짓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요즘 유행처럼 쓰는 외국어를 놔두고 순우리말로 이름을 짓겠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내 일이 바쁜데도 표준국어대사전과 내가 모아 놓은 순우리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뒤졌다. 그러고는 공간에 어울릴 만한 이름 몇 개를 추천하고, 그 밖에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골라 쓰라고 순우리말 70여 개와 뜻풀이를 함께 적어 보냈다. 그렇게 해서 공간 ‘파니’(휴게실), ‘길트기꾼’(공유작업실), ‘곰비임비터’(새활용 체험과 교육 공간), ‘도래도래터’(복합문화공간, 쉼터), ‘다락마루’(문화공간)라는 순우리말 이름을 가진 공간이 만들어졌다.
“외국어 남발에 우리말은 조사만 남을까 걱정스러워요.”
2019년 한글날 즈음에 내 이야기가 실린 한겨레 신문 제목이다. 그때 나는 전주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공모 사업에 지원해 <우리말 지킴이 ‘숨’>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과 우리말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이게 기사로 실렸고,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다.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판을 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 혼자 기관에 전화해서 항의한들 이미 정해진 이름이 바뀔 리도 없고,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멋지다는 그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 전화를 받고 외국어를 쓰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왜 우리말을 써야 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보겠지, 그러면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다. ‘왜 저렇게 외국어를 쓰지?’ 하고 나 혼자 화내는 것에 그친다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