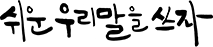[2023 공모전 당선작] 보람상 - 작지만 큰 공직자
- 등록자: 차도영
- 등록일: 2023.10.31
- 조회수: 111
작지만 큰 공직자
차도영(보람상)
나는 현재 공직자다. 예전 시보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다. 공문 쓰는 법, 직무 관련 전문 지식, 민원 업무 등 어려운 것이 많았지만 그중 제일 힘들었던 것을 꼽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었다. 예를 들면, 회계 업무를 할 때 품의, 원인 행위, 지출결의, 추경이라는 단어들과 의회 관련해서는 회기, 상임위, 예결위 등의 단어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내게는 너무 어려웠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한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려운 한자어들이 아닌 외국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타 부서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정책 등 홍보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자주 온다.
공공기관으로서 외국어를 지양해야 하지만 종종 외국어가 섞인 정책명이 자주 보인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경기RE100」’이라는 정책이었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이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하여 명명한 정책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쓰기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명이다. 우리말로 바꾸어 정책명을 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공기관 외국어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서도 외국어는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문화 사대주의 단계까지 이른 것 같다. 키오스크, 클리셰, 드라이브 스루, 오픈런, 바디 프로필 등의 여러 외국어가 티브이(TV)나 누리소통망(SNS) 등의 매체를 통해 전염되듯 퍼져나간다. 우리말로 긴 단어를 외국어로 말하면 간편하고 세련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유행이 공공언어 분야에서도 적용된다면 여러 세대가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외국어를 잘 모르는 편으로 친구들이나 대화할 때 또는 일할 때 사용하는 외국어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다. 예전에 하청 계약을 진행할 때 상사가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하게 있자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벤치마킹, 언택트 등 어디서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단어가 업무 중에 나왔을 때에는 아는 척부터 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직장 동료들과 앉아서 서로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동료가 내게 ‘부스터 샷’을 맞았는지 물어보았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나는 더 좋은 백신이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일반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이 나왔냐고 되물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비웃은 적이 있다.
그 창피한 경험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인터넷에 의미를 찾아보았다. ‘추가 접종’이란 뜻이었는데 ‘추가 접종’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어렵게 ‘부스터 샷’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주변과 어울리기 위해 이것저것 맞춰가는 성향이지만 충분히 우리말로도 의미 전달이 쉽다면 외국어는 일절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부스터 샷’을 ‘추가 접종’으로, ‘아웃소싱’을 ‘용역’으로, ‘벤치마킹’을 ‘견학’으로, ‘언택트’를 ‘비대면’으로 바꾸어 생활하였고, 주변 상사 및 동료분들도 조금씩 어려운 외국어를 줄여나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다. 순우리말은 아니며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이지만 나름 정통성을 지켰다는 사실에 보람찬 마음이 들었었다.
2년 전쯤 ‘시민들이 모르는 공공언어’ 제목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공공언어 인식 조사를 한 결과 평균적으로 시민들은 140개 공공단어 중 97개를 모르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81개를 모른다는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국어기본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범에 맞춰 써야 하지만 그걸 아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공공언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만큼 공무원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100만 명의 공무원 중 나 하나 노력한다고 크게 바뀌는 게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단어를 바꿈으로써 부서가 조금씩 변해갔듯이 나의 작은 날갯짓이 큰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상기하면서 나는 오늘도 공문을 작성한다.